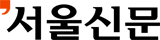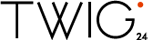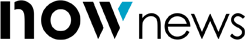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7509_682597_5540.jpg)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와 신작 출시 준비로 분주하던 게임업계가 때아닌 ‘중독’ 프레임에 걸려 발칵 뒤집혔다.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밀집한 ‘게임산업의 메카’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이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공모전을 개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업계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표현 삭제’라는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성 해명뿐이었다.
■성남시의 불씨, 복지부의 기름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이다. 센터는 공모전 주제로 ‘4대 중독(술, 마약, 도박, 게임)’을 명시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개발자 및 전문가 단체들은 즉각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창작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공모전 요강에서 ‘게임’이라는 단어만 삭제했을 뿐, 상처 입은 게임업계와 종사자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없었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그대로 반영했을 뿐,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책임을 넘기는 데 급급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60개 중독관리센터 중 40여 곳에서 이미 게임 중독 관련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10년 전 폐기된 법안의 망령과 끝나지 않은 논쟁
‘4대 중독’이라는 표현은 2013년 당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비롯됐다. 당시 복지부가 적극 동조하며 캠페인까지 벌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행정기관의 지침에는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 역시 아직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현재 민관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일뿐,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앞장서 게임에 질병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내 13개 게임·인터넷 관련 협·단체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창작, 산업, 문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체”라며 “도박, 알코올, 약물과 나란히 열거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과 오해는 그 자체로 실질적인 피해”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표현의 시정을 공식 요청했다.
■단순 ‘과민반응’ 아닌 생존의 문제
일각에서는 이를 게임업계의 ‘과민반응’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중독’이라는 편견과 싸워온 업계의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게임 과몰입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게임 자체를 중독 물질로 간주하고 특정 이용 행태를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이러한 낙인은 게임 이용자들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취급하게 만들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돌이킬 수 없이 추락시킬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70%를 책임지는 게임산업을 술·담배처럼 규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이른바 ‘게임 중독세’와 같은 족쇄를 채울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 등 거대 자본이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 게임산업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나 과학적 검증 없이 가해지는 ‘중독’이라는 낙인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