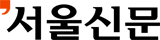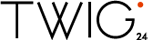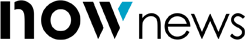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대체당은 각각 다르게 작용하고, 효과나 부작용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다수의 유통 제품에서는 ‘제로’ ‘무설탕’이라는 단순한 문구만 표기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분이 사용됐는지, 얼마나 섭취해도 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4071_678545_5737.png)
‘덜 단맛’이 건강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식품 시장의 소비 흐름을 바꾸고 있다.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음료, 아이스크림, 양념육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한다는 착시 소비가 오히려 또 다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품은 쏟아지지만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실제 식품가의 저당·무당 전환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다.
A 편의점의 경우 지난달 저당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대비 66.8% 증가하며 전체 매출 중 16%를 차지했고, 한 대형마트의 설탕·물엿 판매 코너는 현재 절반 이상이 대체당 제품으로 채워졌다. 3년 전만 해도 설탕 대비 8 대 2 수준이던 대체당 매출 비중이 올해 1 대 1로 역전된 것이다.
이제 대체당 제품은 디저트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품업계는 집에서 구워 먹는 양념육, 데우는 간편식, 병음료, 소스류에까지 대체당을 적용해 ‘무설탕’ ‘라이트’ ‘제로 칼로리’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저당 제품 수요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당을 ‘무해한 당’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하윤(23)씨는 “어차피 먹는 거라면 칼로리 부담이 적은 걸 고르게 된다”고 말했다. 당뇨 전 단계로 ‘제로’ 제품을 주로 구매한다는 송인교(마포구·38)씨도 “‘제로’면 일단 제품 구매 시 안심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칼로리가 낮다’는 마케팅 문구가 섭취 권장량을 무시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대체당이라고 해서 전부 안전한 것은 아니며 과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단기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사 영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당은 크게 스테비아(Stevia), 에리스리톨(Erythritol), 알룰로스(Allulose) 총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기 체내에서 작용하는 방식, 소화 흡수 속도, 대사 경로가 다르며 이에 따라 허용 섭취량과 부작용 가능성도 달라진다.
각 성분별로 체내에서의 대사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식품·유통업계의 ‘저당 마케팅’이 소비자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품 대부분은 제로 또는 무설탕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지만 구체적인 성분 함량이나 허용 섭취량에 대한 정보는 뒷면 라벨에 작게 표기되는 수준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대체당 관련 법적 기준은 일부 인공감미료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천연 유래 감미료나 알룰로스 등 신유형 대체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제로’ 마케팅은 소비자 니즈에 대한 반응이자 생존 전략이지만 결국 식품의 본질은 ‘적절한 섭취’에 있다”며 “건강은 성분보다 습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당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일 뿐 절대적인 ‘건강 성분’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분 투명성 확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