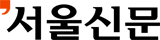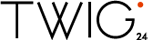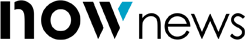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 소비에 대한 주의와 건강한 소비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설탕 함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다시 검토하면서 ‘달콤함’의 가치가 건강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144_700779_3636.png)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장 손이 잘 가는 음료는 언제나 ‘달콤한 맛’이다. 그러나 그 익숙한 달콤함에 세금이 붙을지도 모른다. 정부와 정치권이 설탕 함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재논의하면서, 이번에는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소비문화의 전환’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소비의 기본값이던 ‘단맛’이 건강, 불평등, 책임의 프리즘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 건강이다. 보건복지부는 당류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강은 개인의 선택이며, 세금으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건강을 위해 음료를 덜 마시면 되는 건데 결국 세금은 서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장인 하연주(33)씨는 “가격이 올라야 소비가 줄지, 지금은 너무 쉽게 달콤한 음료를 사 마시게 된다”며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라고 말했다.
결국 설탕세는 자율과 공공책임이 충돌하는 경계선에 서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비만 억제가 아닌 ‘건강 격차 해소’의 정책으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비만은 단순한 식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반영”이라며 “저소득층일수록 값싸고 고당류인 가공식품 소비 비율이 높다. 설탕세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강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윤 단장은 “영국의 경우 설탕세 도입 후 단맛이 많은 음료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고, 어린이 비만율과 천식 발병률이 동반 감소했다”며 “우리 사회도 건강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당류 섭취량은 상위 20%보다 1.5배 높다. 영국·칠레 등 설탕세 도입국에서는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윤 단장은 “설탕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걷힌 세금은 청소년, 노인 대상 건강 프로그램이나 공공병원 확충 등 건강 불평등 해소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식품업계는 세금보다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당 저감’을 브랜드 철학으로 삼으며 ‘착한 단맛’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카콜라는 제로슈거 라인을, 네슬레는 천연감미소재를 전면 도입하며 브랜드 리포지셔닝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풀무원·오리온·빙그레·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 등이 ‘제로·저당’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단순한 상품 전략을 넘어 건강 책임(Health Responsibility)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식품산업 분석가는 “소비자들은 설탕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기업의 태도 문제로 본다”며 “어떤 기업이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가가 신뢰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는 결국 달콤함을 중심에 둔 소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건강을 선택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소비를 쾌락이 아닌 균형으로 바라보는 문화적 전환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