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중국 수출 확대 여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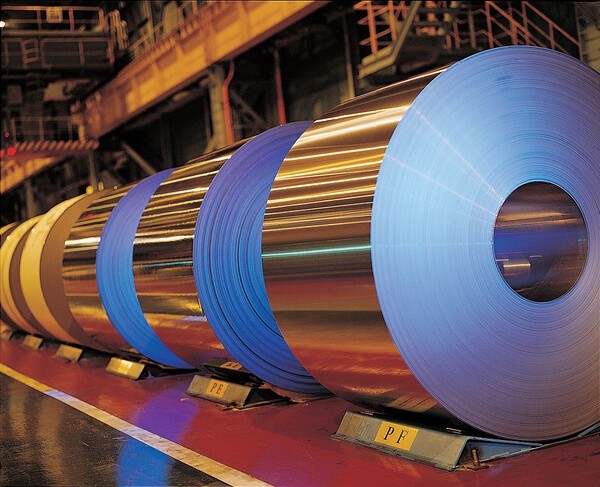
건설업 경기침체와 수요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지난해 조강 생산량도 약 30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에 집중하며 생산량 조절에 나섰지만 수익성 방어를 위한 가격인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중국의 수출 확대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이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글로벌 조강생산량은 1억4680만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이를 포함한 지난해 1~11월 누적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16억9460만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의 생산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2.5% 증가한 7840만톤을 생산해 전월(8190만톤, 2.9%)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인도 역시 4.5% 늘어난 1240만톤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누적 생산량은 중국이 9억2920만톤, 인도는 1억3590만톤을 기록했다. 누적 생산량의 경우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감소폭이 2.7%로 축소됐고 인도는 증가폭이 5.9%까지 확대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520만톤을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누적 생산량은 5830만톤으로 4.9% 줄어들었다. 일본 역시 감소세를 이어가며 누적 생산량은 3.6% 감소한 7710만톤을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 한국의 12월 조강 생산량이 520만~530만톤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생산량은 약 635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2021년(7042만톤) 7000만톤을 돌파했으나 2022년 6585만톤, 2023년에는 6668만톤에 그쳤다. 지난해는 2023년보다 300만톤 정도 줄어들었다.
철강사들은 건설 등 전방산업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생산설비 유지보수를 늘리면서 생산량을 조절해왔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2023년 대비 안정화되긴 했으나 수요부진으로 철강재 가격 하락폭이 더 컸으며 철근, 봉형강 등 전기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가격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다.
후판 시장에서도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조선업계와의 하반기 협상이 해를 넘겼다. 2023년 하반기 톤당 90만원 후반에 합의했던 후판 협상은 지난해 상반기 90만원 중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2023년말 철광석 가격이 톤당 14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음에도 가격인하 요구를 수용해야 했던 철강업계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조선업계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조선업계가 장기간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철강업계가 양보했던 만큼 수주 증가로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가 이제는 철강업계를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도 조선향 후판은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는 제품이었다"며 "현대제철이 후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업계는 여전히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후판 가격이 중국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산 후판의 품질이 개선된 것도 조선사들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후판도 선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예전보다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며 "국산 후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좋지만 중국산과 가격차이가 상당할 경우 수익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에 대해 철강업계는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다. 극심한 침체기를 겪은 건설업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년 전에도 이와 동일한 전망을 내놨던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시국과 같은 변수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수부진으로 수출을 늘려왔던 중국의 행보도 한국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올해도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며 경제성장과 철강 수요를 억누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올해 중국 건설용 철강 수요가 지난해보다 2000만톤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조선을 비롯해 자동차, 기계, 가전, 에너지향 철강 수요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이나 철광석, 원료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철강업계의 가격인상 노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 철강 수출량은 1억115만톤으로 12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미 1억톤을 돌파했다. 중국의 연간 철강 수출량이 1억톤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내수부진으로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을 늘려왔으나 미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무역제재 본격화에 앞서 중국의 철강 수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