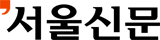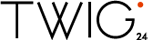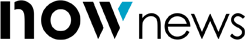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690_701408_4250.jpeg)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은행에서 채무조정을 승인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이었다. 이 가운데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보험사(99.1%),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95.2%), 대부업(85.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저축은행(60.2%)이나 상호금융(76.6%)보다도 뒤처진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고 무리한 추심을 막기 위한 제도다. 대출금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대환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전체 채무조정 중 원리금 감면이 이뤄진 경우는 2051건(중복 포함)으로 전체의 14.2%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99억원이다. 같은 기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32.2%)나 대부업(88.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은행 18곳 중 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실시했다. 이자만 감면한 씨티은행을 포함해도 7곳에 그친다.
은행권에서는 “연체 기간이 짧은 단기 채무자가 많아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나 대부업체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아 감면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적이 전무했던 케이뱅크는 채무조정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대환대출이나 상환기간 연장 중심으로만 운영하던 채무조정 대출에 연체이자 감면을 다음 달부터 도입하고, 내년에는 원리금 감면 방식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