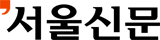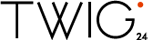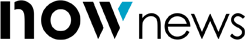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저가형·가성비' 전기자동차가 인기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판매가 급감했음에도 단 3개월 만에 1만대 가량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전기차 캐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격이 해소되자 시장에서 점차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올해 1~11월 완성차 업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아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3'는 출시 4개월 만에 1만2390대를 판매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1만7671대를 판매한 테슬라의 '모델 Y'가 차지했으며, 현대차 '아이오닉 5'는 1만3602대를 팔아 2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저가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레이 EV'의 판매량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차의 상업용차 '포터 EV'와 테슬라 '모델 3'가 각각 4위(1만885대), 5위(1만319대)를 차지한 가운데, 기아의 '레이 EV'가 6위(9907대)를 차지했다. 캐스퍼 일렉트릭' 또한 판매 4개월 만에 전기차 판매량 8위(7431대)에 이름을 올렸다.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기존 전기차 모델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밑도는 가운데, 가성비 및 저가형 신차가 출시되면서 시장을 떠받드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 원인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내연기관차보다 유지비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내연차보다 비싼 까닭에 구매를 꺼린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테슬라는 지난해 6000만원대에 판매하던 모델 Y의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트림을 추가하고,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인건비 및 재료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며 국내 판매 가격을 700만원가량 낮췄다.
전기차 시장 리더십 확보를 노리는 기아는 EV3를 선보였다. 고성능 배터리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적용, 주행거리를 내연기관차 수준인 500km까지 확보했다. 또한, 전기차에 특화한 각종 편의사양을 탑재하면서도, 보조금 활용 시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가격대인 3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현대차·기아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소형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30~40%를 차지한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 주행거리는 줄이되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저가형 전기차로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는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보조금 활용 시 200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데다가, 유지비는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소형 전기차로 눈길을 돌렸다. 전문가들은 10~15%의 '얼리어댑터'가 전기차 구매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더는 비싼 가격대의 전기차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완성차 업체는 향후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배터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보급형 NCM 배터리를 신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급형 NCM 배터리는 가격대가 비싼 니켈 비중을 줄여 기존 NCM 배터리 대비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개선해 성능은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아는 오는 2025년 준중형 전기 세단 'EV4' 출시를 예고했다. 가성비 전기차인 EV3부터 플래그십 전기차 EV9까지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고, 전기차 시장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각 브랜드는 전기차 원가 절감을 위해 배터리와 차체가 통합된 구조를 연구개발하는 등 노력을 이어간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가격이 문제 아니겠냐"면서 "완성차 제조사는 가격을 낮추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