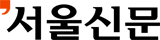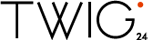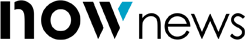요즘 국내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이다. 여러 언론에 ‘2030 전기차 50%’ 비중이 언급되자 진위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다. 여전히 그 어디에서도 공식 확인된 바 없어서다. 발단은 소문이다. 일부 언론이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 50%’를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지만 근거로 삼은 출처 어디에도 ‘전기차 50%’ 문구는 나오지 않는다.
소문(?)에 대해선 집권 여당도 당혹감을 나타낸다. 대선 공약집에도 ‘전기차 50%’는 없는 탓이다. 다만,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구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기차 비중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는 나오지 않는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마치 사실처럼 인용되며 실현 가능성 여부만 왈가왈부될 뿐이다.
그런데 2030년이라는 시점을 정하지 않더라도 최근 날씨는 기후변화를 실감케 한다. 동남아의 이국적 풍경에서 즐기던 과일이 한반도에서 재배되고, 바다 속에선 따뜻한 수온을 찾는 다랑어가 떼로 몰려다닌다. 체온보다 높은 외부 온도가 이상하지 않고 장마라는 용어도 과거의 단어일 뿐이다. 일부에선 가을을 의미하는 추석이 곧 여름 한 가운데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심지어 중부 유럽은 빙하가 빠르게 녹아 홍수가 일상으로 바뀌는 중이다. 심각한 기후변화 탓에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EV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후변화를 실감할수록 각 나라의 EV 보급 확대 의지는 높아진다.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는 공동체적 교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탄소 문제는 ‘잘 살고 못 사는’ 논쟁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불어닥치는 재앙이 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기후 문제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부에선 탄소 규제를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 생존과 직결된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2030 전기차 50%’는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없더라도 한국 또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가야 할 방향적 성격이 짙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새롭게 손질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보급 목표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늘어나려면 관련 생태계 구축도 중요하다. BEV 구매 이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탄소 감축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 이때 활용 가능한 방법은 탄소에 경제적 가치 부여, 그리고 운행 과정에서 혜택 및 경제적 장점이다. 배출권으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도록 하고 운행 과정에선 편리함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에도 경제성이 부여돼야 한다. 탄소 배출에 따른 추가 부담을 내연기관에 씌우지 않는다면 EV에 보다 많은 혜택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제도적 개선을 통해 최대한 보급 대수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