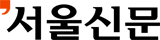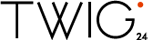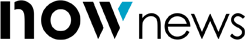한국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2조4항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자동차 부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사가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마디로 제조사가 잘못 만들어 시정 조치에 나선 만큼 이용자도 직접 찾아내 선제적 조치가 되도록 책임지라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된 시점이 오래돼 이미 소유자가 여럿 바뀌었거나 연락처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1조2항은 리콜 대상자에게 사실을 알릴 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강제하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이외 우편과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지만 지면 신문을 아예 접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중고차 거래가 신차보다 많아 주소지 변경도 비일비재다. 신차 판매 이후 개인정보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다. 리콜 시행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차가 의외로 많이 남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락불통인 셈이다. 특히 치명적인 주행 안전 리콜의 경우 여전히 받지 못하는(?) 또는 받지 않는 차가 문제다.
그런데 이때 활용 가능한 것이 정부의 자동차검사 제도다. 자동차관리법 43조1항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때 검사원은 검사 차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 등이 등록된 전산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 마디로 국내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정보는 이미 전산화가 돼 있고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 해당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조회 가능한 시스템도 이미 만들어놨다.
정부도 리콜 대상 소유자가 주행 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화재가 발생한 2020년식 BEV는 배터리 리콜 대상이었지만 소유자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는지, 아니면 연락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전에 무언가 조치됐다면 화재 발생 가능성은 낮추었을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그리고 이때 자동차 검사 제도를 활용했다면 충분히 문제는 걸러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리콜 조치를 검사 때 걸러내자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관한 리콜이 발생할 때만 적용하면 된다. 해당 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리콜 조치 여부를 합격 판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리콜 조치 미비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다. 제조사는 연락이 어려운 소비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국토부는 도로 위 사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는 ‘윈-윈(win-win)’ 효과다. 당연히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검사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면 안전 문제 리콜과 적극 연계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이 경우 리콜 시정율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현행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차의 기본 안전 장치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문제가 없는지 검사한다. 그러나 추가 검사 항목에 안전 문제 리콜 대상차의 정보를 연동시켜 검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제도 변경을 통해 혹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일부 예방할 수 있다면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 검사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자동차 안전 운행인 만큼 안전 리콜과 자동차 검사 제도 연계는 목적 달성에 더욱 가까워지는 노력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