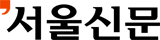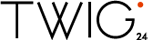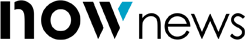![제약·바이오 업계가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공=픽사베이]](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2643_653901_5834.jpg)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가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들과 비교해 자본 투입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AI를 활용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은 연평균 45.7%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40억3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AI 신약 개발 시장은 지난 2021년 1340만 달러에 그쳤지만, 전세계에서 9번째로 성장해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연평균 34.6% 성장해 2026년에는 59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글로벌 시장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약사들이 AI 신약개발사들과 협력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나선 상황이다.
신약 개발의 경우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한데, 임상시험에서 신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분야다. 이런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간 단축은 물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신약 개발에 AI 활용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I 신약개발 데이터는 생물학, 화학, 약리학, 임상 영역 등에서 수집된 신약 개발 전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실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질병 패턴 분석이나 임상시험 설계 등 다양한 분양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딜로이트의 ‘제약 혁신의 수익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의 신약후보물질을 출시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처음 선별된 1만개의 후보물질 중 오직 10개만이 임상 시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기준 글로벌 상위 12개 제약 회사의 한 약품당 평균 R&D(연구개발) 비용이 21억6800만 달러(약 3조원)라고 추산했는데, 이는 2010년에 추산된 11억8800만 달러의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임상 시험의 첫 단계인 1상 임상 시험에 진입할 확률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이 수치는 10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다. 시장에 약품을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의 정확도를 10% 향상시키면 신약 개발에 드는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AI를 활용할 경우 개발 기간은 최대 7년 단축되며, 비용은 약 4억5000만 달러 규모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 역시 AI 기업과 손잡고 의약품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은 크리스탈파이, 온코크로스, 닥터바이오텍과 같은 AI 전문기업과 협업해 신약 개발에 나섰고, 자체적인 AI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2021년에는 AI 신약개발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신테카바이오와 유전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손을 잡았고, 이후에도 사이클리카 등 4곳과 협력에 나섰다. 또한 녹십자, 보령, JW중외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들이 AI 활용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R&D 비용은 글로벌 빅파마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미국의 대표 제약사 가운데 하나인 MSD(머크)의 지난해 R&D 비용을 보면 305억 달러(약 42조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에서 R&D 비용이 가장 높은 셀트리온이 3500억원에 그친 것만 봐도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다.
이에 글로벌 의약품시장에서 자본력이 현저히 밀려있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선 신약 개발 등에 있어서 AI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높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해외 제약사들과 근본적으로 체급차이가 있어 직접 경쟁은 어려운 수준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AI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를 활용하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SK바이오팜, 3분기 영업익 193억원…창사 이래 첫 4분기 연속 흑자
- 듀켐바이오, 상장 예비심사 통과…“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도약”
- [美 트럼프 재집권] “기회 증가” vs “경쟁 심화”…K-바이오시밀러, 기회·우려 교차
- [美 트럼프 재집권] '자국 우선주의' 강화…K-바이오 방안 모색
- 주요 산업으로 성장한 ‘바이오’ 특허 우선심사 도입에 수혜
- 셀트리온 “3분기 매출 분기 최대”…영업익은 전년비 22%↓
- 휴온스, 3분기 영업익 87억원…전년비 41.9%↓
- 유통학회도 칭찬한 무탠다드…"입점 브랜드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 ‘ESG 경영 저조’ 바이오벤처의 이유 있는 항변
- 메디톡스, 3분기 영업익 60억원…전년比 67.9%↑
- ‘긴 호흡 유지’ 제약·바이오 분야 인사 시즌 무난 예상
- "주사 아닌 알약"…대웅제약,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 박차
- GC녹십자, 동아에스티와 손잡고 염증질환 신약 개발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투약환자 중증도 검사 국내 상용화